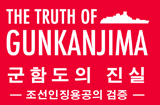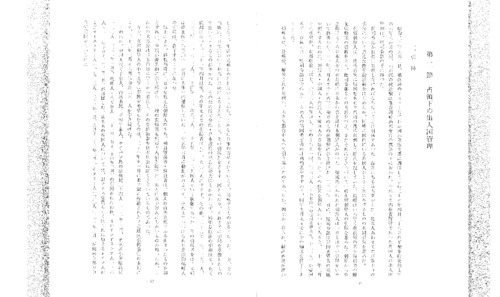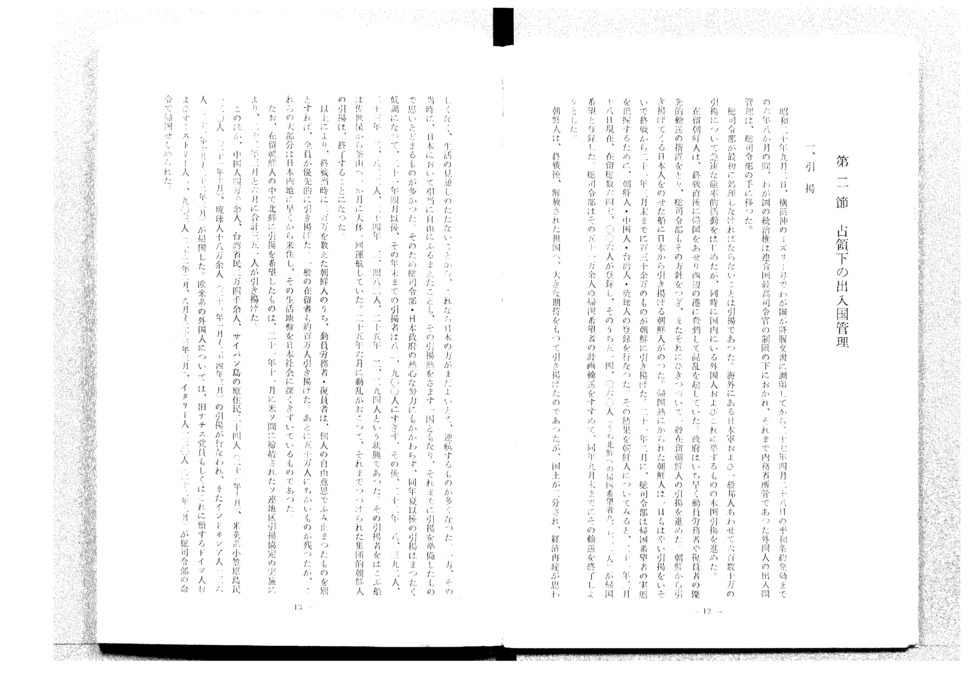Page 1
1, 귀환
요코하마 앞바다의 미주리호 선상에서 우리 나라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1945년9월2일부터 1952년4월28일 평화조약 발효까지의 6년 8개월 간, 우리 나라의 통치권은 연합국최고사령관의 제한 하에 옮겨져서, 그때까지 내무성소관이었던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는, 총사령부의 손으로 옮겨졌다.
총사령부가 맨 먼저 처리 해야 할 것은 귀환 사업에 관한 것이었다.해외 일본군 및 일반 일본인 총 600수십만명의 귀환에 대해서 급속한 능률적 활동을 시작했지만, 동시에 국내 외국인 및 이것에 준한 자들의 귀환 사업을 진행했다.
종전 직후, 귀국을 서두른 재류 조선인들이 일본 서쪽항구에 쇄도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다.정부는 재빨리 동원 노무자나 복원한 자들의 우선적 수송의 조치를 취하고, 총사령부도 그 방침을 계승하고,또 그것에 이어서 일반재류 조선인들의 귀환 사업을 진행했다.조선에서 귀환하는 일본인들을 태운 배에, 일본에서 귀환하는 조선인들이 탔다.충동에 사로잡힌 조선인들은 한시라도 빠른 귀환을 위해, 1945년8월의 종전으로부터 1946년 3월말까지 130여만명이 조선에 귀환했다.1946년2월에, 총사령부는 귀국을 희망하는 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선인·중국인·대만인·류큐인의 등록을 했다.조선인에 대해서 보면, 1946년3월18일 현재, 재류 총수 647, 006명이 등록하고, 그 중 514, 060명 (그 중 북한에 귀국을 희망하는 자 9, 701명)이 귀국을 희망 한다고 등록을 했다.총사령부는 그 중 51만여인의 귀국 희망자에 대해서 계획적 수송사업을 진행하고, 동년 9월말까지 그 수송 사업을 종료 하려고 했다.
조선인들은 전쟁 후, 해방된 조국에 큰 기대를 안고 귀환 했지만, 국토가 분단되어, 경제재건이 부진하고 생활도 어렵다고 해서, 일본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해서,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많아졌다.한편, 그 당시 일본에서 상당히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다는 점도, 귀환을 단념하는 요인이 되었고, 귀환을 준비했던 사람들 속에도 단념하는 자가 많았다.그러므로 총사령부・일본정부의 열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년 여름 이후 귀환 사업이 매우 저조 해지고, 1946년4월 이후, 그 연말까지 귀환한 자는 82, 900명에 지나지 않았고, 그 후, 1947년 8, 392명, 1948년 2, 822명, 1949년 3, 482명, 1950년 2, 294명이었다. 그 귀환선은 사세보-부산 간을 한달에 한번 씩쯤 운항하고 있었다.1950년 6 월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까지 계속 되었던 집단적 조선인들의 귀환은 종료되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종전 당시 이백만을 넘는 조선인들 중 동원 노무자 · 복원자들은 그들의 판단으로서 단념한 자를 제외하면 모든 사람이 우선적으로 귀환했다.일반 체류자도 약 백 만명이 귀환했다. 그 후,약 오십만명이 머물렀지만, 그 대부분이 일찍부터 일본 사회에 생활 기반을 깊이 구축하고있는 사람들이었다.
또한, 재류 조선인들 중, 북한에 귀국을 희망 한 자는, 1946년 11 월에 미국-소련간에 체결 된 “소련 지구 인양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라,1947년 3월과 6월에 총 351명이 귀환했다.
그 외,중국인 41,000여명, 대만성민 24,000여명,사이판 원주민 24명 (1946년 10월) 영국・미국 계통 오가사와라 도민 120 명 (1946년 10월) ,류큐인 18 만여 명 (1946년 1월~1949년 3월)이 귀환했고,또 인도네시아인 136명 (1946년 10월 ~1947년 3월)이 귀국했다.구미 계통 외국인은, 구 나치스 당원 또는 이와 유사한 독일인 및 오스토리아인 1903명 (1947년2월 ~1948년 3월), 이탈리아인 (1947년 2월)이 총사령부의 명령으로 귀국 시켰다.